한국어 문법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만들고 것을 형태론이라 말한다.
형태소가 무엇인지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1. 형태소

1) 형태소 :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소리의 단위. 여기서 의미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 어휘적 의미는 실사의 의미이고, 문법적 의미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허사의 의미이다.
‘하늘이맑다’ → 하늘, 이, 맑-, -다 = 하늘(명사)/이(조사) 맑/다
| 하늘이 맑다 | 하늘 | 이 | 맑 | 다 |
| 아서 | ||||
| 으니 |
2) 형태소의 종류
ㄱ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형태소를 나눌 수 있다.
- 자립 형태소 :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혼자있어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다.
- 의존 형태소 :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간,선어말 어미, 어미, 접사)
할 수 없지 → 하-(의존)/ ᄅ(의존)/ 수(자립)/ 없(의존)/지(의존)
시원하다 → 시원(의존)/ 하(의존)/ 다(의존)
웬 떡이냐 → 웬(자립)/ 떡(자립)/ 이(의존)/ 냐(의존)
ㄴ 의미에 따라 따라 형태소를 날 수 있다.
- 실질 형태소 : 구체적인 대상이나 구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자립형태소 전부, 용언의 어간)
- 형식 형태소 : 형식적인 의미만, 즉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태소(조사, 어미, 접사)
ㄷ 이형태(異形態) : 하나의 형태소이나(의미 동일) 다른 형태를 가진 형태소들을 이형태라고한다.
(일반적으로 표제어를 정하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용이한 편을 따른다.)
- 음운론적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음운 환경에서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이형 태를 뜻한다.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이/가,을/를 형태소가 2개가 아니다. 하나인데 모양이 다르다.
특이한 음운론적 이형태로, 소위 방향 부사격 조사 ‘로/으로’ 와 ‘시,/으시’
→선행하는 음운이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으’를 매개모음으로 보는 입장도 있음)
- 형태론적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이다. (음운론 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였/었’ →‘-었-’이 기본 형태이지만, 특별히 ‘하-’ 어간 뒤에서는 ‘-였 -’으로 바뀌게 된다.
명령형 어미 ‘어라/너라’ →‘-어라’가 기본 형태이지만, 특별히 ‘오-’에서만 ‘-너라’로 바뀌 게 된다.
<
2. 단어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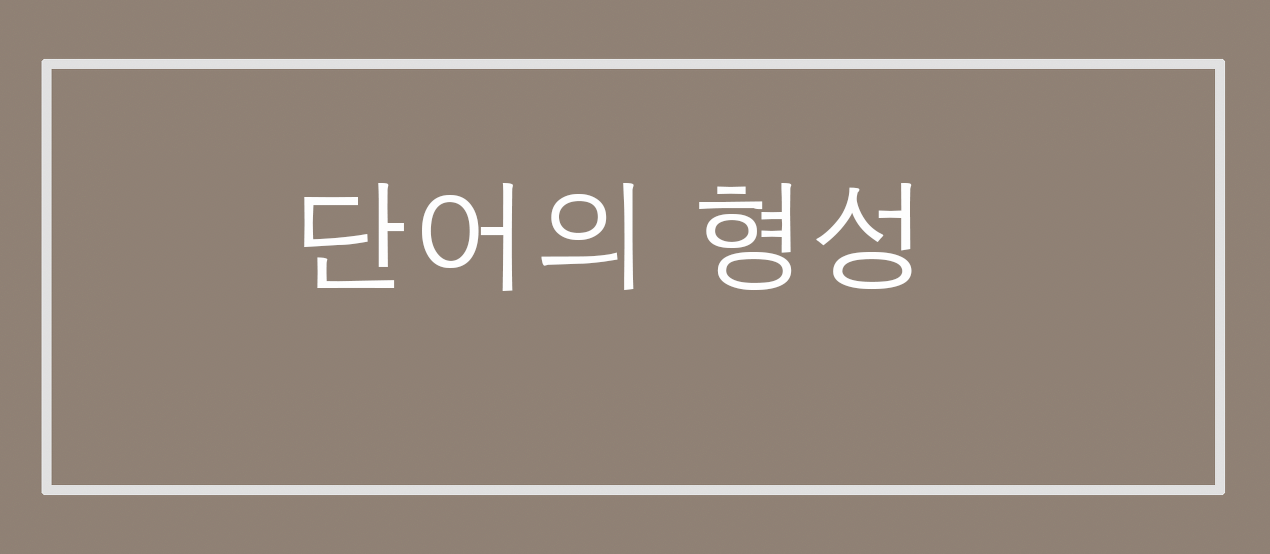
1) 단어 :
자립할 수 있는 말,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같은 자립 형태소는 그대로 하나의 단어가 되고, 의존 형태소인 ‘맑-’, ‘- 다’는 ‘맑다’처럼 서로 어울려야 비로소 하나의 단어가 된다. 쉽게 말해 사전에 하나로 나와야 하나의 단어라 볼 수 있다.
| 음운 | 형태소 | 단어 |
|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 | 최소의 의미단위 | 최소 자립단위 |
| 마 ㄹㄱ 다 | 맑-, -다 | 맑다 |
2) 단어의 종류
| 1. 자립할 수 있는 말 | 2. 의존형태소이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
|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어간+선어말어미+어미’(동사, 형용사) |
조사= 형태소를 분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
3) 단어의 형성
1 단일어 :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어
2 복합어 : 둘 이상의 어근이나(합성어), 어근과 파생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파생어)
| 단일어 | 복합어 | |
| 합성어 | 파생어 | |
| 산,하늘,맑다 | 어깨+동무, 앞+뒤, 작(은)+아버지, 뛰(어)+나다 |
풋+사랑, 치+솟(다), 잡+히(다), (평+화)+-적, (공+부)+-하-+-다 |
| 새큼(어근)+달큼(어근) +-하(파생 접사)-+-다(굴절 접사) |
||
- (‘새큼달큼하다’는 어근 끼리 직접 결합한 합성어이다. 이 합성어에 다시 파생 접사 ‘-하-’ 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되었다. )
* 참고: 어근, 접사, 어간, 어미
* 의미의 중심여부
- 어근 : 단어의 중심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 단어 분석 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 접사 : 단어의 부차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거나,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형식형태소
| 어근 |
접사: 단어의 부차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 |
| 단어의 중심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 접두사 | 접미사 |
| 어근의 앞에 붙는 것 | 어근의 뒤에 붙는 것 | |
| 손, 버선, 집, | 맨+손(어근), 덧+버선(어근) | 덮(어근)+개, 지(어근)+붕 |
- 기능에 따라
한정적(同種的)접사 - 품사는 그대로 두고 어근의 뜻만 제한하는 것. (굴절 접사) 집 + 웅, 덧(접사) + 버선(어근)
지배적(異種的)접사 - 품사를 바꾸는 접사.(=파생 접사) 덮개(동→명), 사람답다(명→형)
- 활용 시 변화여부
- 어간 : 용언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 ; 기본형에 붙는 모든 종류의 어미
- 어미 : 용언 활용 시 변하는 부분 ; 어근에 붙어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부분
4)복합어: 파생어 - 접두사와 접미사를 통해 만들어짐
: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어근의 앞에 붙는 파생접사는 접두사, 어근의 뒤에 붙는 파생 접사는 접미사) 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군+소리 한+겨울 =접두사
(ᄀ) 접두사에 의해서 파생된 단어 :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즉 뜻을 한정하는 의 미적 기능(한정적 접사)을 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 접두사는 접미사에 비해서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 분포에 있어서도 명사, 동사, 형용사에만 존재하고 있다.
* 품사가 정해진 경우의 접두사 사용
명사 : 군소리, 날고기, 맨손, 돌배, 한겨울
동사 : 짓누르다, 엿보다, 치솟다
형용사 : 새까맣다, 얄밉다, 드높다
* 명사 용언 이런 품사들 앞에 어떤 것이 와서 이 본래의 덩어리를 제한시키거나 섬세하게 하거나 풍부하게 한다. 이것이 접두사의 역할이다.
* 명사와 용언에 두루 쓰이는 접두사 - 헛수고, 헛되다/ 애호박, 앳되다/ 덧신, 덧신다.
접두사 중에는 품사를 바꾸는 통사적 접사(지배적 접사)도 존재한다.
메마르다, 강마르다 → 동사인 ‘마르다’를 형용사로 바꾸어 주고 있다.
숫되다, 엇되다 → 동사인 ‘되다’를 형용사로 바꾸어 주고 있다.
* 접두사는 나름대로의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때로는 그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
‘올-’ → ‘올벼/오조’ ‘애-’ → ‘앳되다/애호박’ ‘멥-’ → ‘멥쌀/메벼’
• 관형사와 관형사성 접두사, 부사와 부사성 접두사 구분 : 중간에 다른 말을 넣을 수 있 으면 각각 관형사와 체언, 부사와 용언인 두 개의 품사이고, 넣을 수 없으면 체언 및 용 언에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이다.
맨 쓰레기밖에 없다. → ‘모두, 온통’의 뜻 (맨 더러운 쓰레기밖에 없다)
맨손 체조 →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의 뜻 (맨 깨끗한 손 체조)
• 접두사의 의미
돌- : ‘품질이 나쁜 것’이나 또는 ‘산과 들에서 저절로 생겨서 사람이 가꾼 것보다 못하게 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
홀- : ‘짝이 없고 하나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시- : ‘시집’의 뜻을 나타내는 말
양- : 서양 및 동양, 특히 ‘서양’을 줄여서 이르는 말
올- : ‘열매가 보통 것보다 일찍 익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풋-:‘처음나온’또는‘덜익은’의뜻을나타내는말 (풋고추,풋나물) ‘미숙한’, ‘깊지 않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풋사랑, 풋 잠)
(ᄂ) 접미사에 의해서 파생된 말 :
뜻을 더하는 의미적 기능뿐만 아니라 어근의 품사를 바꾸 는 문법적 기능도 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 접미사는 접두사에 비해 숫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분포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다. 접미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되는 품사 유형 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등 매우 다양하다.
* 어근에 어휘적 접사가 붙어 본래의 품사가 그대로 유지된 파생어
파생체언 : 못쟁이, 잎사귀(명사) ; 너희, 그들(대명사) ; 열이, 셋째(수사)
파생용언 : 밀치다, 깨뜨리다(동사) ; 거멓다, 높다랗다(형용사)
파생 부사 : 더욱이, 다시금(부사)
* 본래의 품사를 바꾸는 통사적 접사가 붙은 파생어 (지배적인 접사)
파생체언 : 물음, 넓이, 개구리(명사) ; 그대 (대명사); 첫째, 두어째(수사)
파생용언 : 공부하다, 좁히다, 철렁거리다(동사) ; 가난하다, 미덥다, 반듯하다(형용사) 명사가 형용사로 바뀜.
파생부사 : 진실로, 마주, 멀리, 없이, 있이(부사)
5)복합어 : 합성어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ᄀ) 통사적 합성어 : 통사적 합성어는 통사론적인 시각에서 볼 때 두 어근 또는 단어가 연결된 방식이 문장에서의 구나 어절의 구성 방식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 우리나라말의 일반적인 문장순서 구조대로 단어가 결합된 현상.
(ᄂ) 비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우리말의 통사적 구성 방법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형성된 것을 말한다.
아래는 비통사적인 합성어다.
1 용언과 체언이 연결될 때 소위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생략되는 현상 :
늦(은)잠=늦잠, 늦(은)더위=늦더위, 꺾(은)쇠=꺾쇠, 덮(은)밥=덮밥, 접칼(작은집, 큰집, 쥘손) (일반적 상황이 아님= 비통사적)
2 용언과 용언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연결 어미(-아/어, 게, 지, 고)가 생략되는 현상 :
열(고)닫다= 여닫다, 울(부)짖다= 우짖다, 검(고)푸르다= 검푸르다 ; 뛰(어)놀다=뛰놀다, 잡쥐다(들고나다, 돌아가다)
3 국어의 부사는 용언이나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인 원칙인데 부사가 체언 앞에 오는 현상 :
(순서가 바뀜) 비가 부슬부슬 온다 =부슬비, 고개가 헐떨하다 =헐떡고개, 새가 촐랑되다 =촐랑새
4 한자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구성으로 우리말 어순과 다른 방식을 보이는 것이다. 한자어가 이에 해당됨다.
(목적어 와 부사어가 서술어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 독서, 급수 ; 등산(일몰, 필승, 고서)
| 합성어와 구의 차이점 | |
| 큰형(합성어)= 나이가 가장 많은 형 | 큰 형(구)=키가 큰형 |
| A+B=C. | A+B=AB |
| 합성어 =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짐 | 구 = 두 용어의 의미가 합쳐짐 |
| 두 어근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없다 | 두 어근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감 |
|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하지 않음 | 띄어쓰기를 해야함 |
| 두 어근 사이에 이어서 발음 | 두 어근 사이에 쉼 |
• : 합성어와 구를 나누는 기준은 분리성, 띄어쓰기, 쉼, 의미 변화 등이 있다.
(ᄀ) 분리성(합성어와 구의 가장 중요한 변별 기준) : 합성되는 두 어근 사이에 다른 성분 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합성어는 들어갈 수 없고, 구는 들어갈 수 있 다.
| 나는 큰형한테(합성어) 그 일을 알렸다. => 큰형(합성어)= 나이가 가장 많은 형 나는 큰그형한테 그 일을 알렸다. 키가 큰 그 형은 매우 성격이 좋다. => 큰 형(구)=키가 큰형, |
(ᄂ) 띄어쓰기 : 띄어쓰기 기준은 분리성 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단어이 기 때문에 합성어는 붙여 써야 하고, 구는 두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붙여쓰면 합성어 띄어쓰면 구)
(ᄃ) 쉼 : 띄어쓰기 기준은 곧바로 쉼 기준과 연결된다. 합성어는 단어이기 때문에 두언근 사이를 이어서 발음하고, 구는 두 단어이기 때문에 중간에 휴지를 두어 발음 한다.
(ᄅ) 의미의 특수화 : 합성어에는 의미의 특수화가 이루어지지만, 구는 의미의 특수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형 - 맏형이 아닌 형
작은 형 - 키가 작은 형
'한국어 공부 > 한국어 문법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어 '문장의 종결과 높임법(평서문, 의무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상대높임법,주체높임법,객체높임법)' (1) | 2022.09.25 |
|---|---|
| 한국어 용언(동사, 형용사, 감탄사) (1) | 2022.09.22 |
| 한국어 수식언(관형사, 부사, 관계언,조사) (1) | 2022.09.21 |
| 한국어 형태론 (품사의 분류, 체언, 명사, 대명사, 인칭대명사, 수사) (1) | 2022.0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