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통사론

이번에는 한국어 통사론에서 시간표현, 피동표현, 사동표현, 부정표현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시간 표현:

시제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으로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문법 범주이다.
이것은 선어말 어미, 시간 부사어,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
시제 표현의 종류는 발화시(發時)와 사건시(事件時)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시제는 대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어떤일이 말보다 앞설 때 과거
어떤일이 말과 같은 시기 현재
어떤일이 있고 말보다 뒤에 올 땐 미래시제
(1) 과거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를 말한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 ‘-았었-/-었었-’도 발화시보다 훨씬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는 강하게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어제, 옛날’과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벚꽃 길이었지.
그 해 봄 밤은 정말 포근하게 느껴졌었지.
동사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으)ᄂ’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곤 한다.
형용사 나 서술격 조사 다음에는 회상 선어말 어미 ‘-더-’와 관형사형 어미‘-(으)ᄂ’이 결합된 ‘-던’이 쓰인다.\
네가 먹은 과자는 내가 먹으려고 놔둔 것이었는데.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
과거 어느 때를 기준으로 그 때의 일이나 경험을 돌이켜 회상할 때에는 ‘-더-’를 사용한다.
경수는 어제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더라.
(2) 현재 시제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말한다.
동사에서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ᄂ-’과 관형사형어미 ‘-는’이 쓰이고, 형용사 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ᄂ’이 쓰이거나 형용사 본래의 형태가 그 자체로 현재 의미를 나타낸다. ‘지금/오늘’과 같이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 지수 잘 자는 구나./ 잠을 자는 지수
사람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
(3) 미래 시제 개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를 말한다.
선어말 어미 ‘-겠-’이 대표적이다.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추측이 나 의지, 가능성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서도 쓰인다.)
관형사형 어미 ‘-(으)ᄅ’이 사용되고, 관형사형 어미 ‘-(으)ᄅ’과 의존명사 ‘것’이 결합된 ‘- (으)ᄅ 것이’도 널리 사용되는데, 이는 ‘-겠-’과 의미 내용이 비슷하다. 또 부사어는 ‘내일’ 등 이 쓰인다.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몇 시간이면 떠날 사람이 여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손님은 내일 올 거야.
(4) 동작상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진행상은 현제 시제와 완료 상을 과거시제와 예정상은 미래 시제와 일치한다.
주로 보조 용언 일부가 동작상을 보여 주지만, 때로는 연결어미를 통하여서도 이루어 진다.
(ᄀ) 완료상 - ‘-어 버리다, -아 있다 (보조 용언)’, ‘-고서(연결 어미)’ 등을 통하여 실현
사과를 다 먹어 버렸다. 아연이는 지금 소파에 앉아 있다. 영민이는 밥을 다 먹고서 집을 나섰다.
(ᄂ) 진행상 - ‘-고 있다, -어 가다(보조 용언)’, ‘-으면서(연결어미)’등을 통하여 실현
운동장에서 많은 강아지들이 놀고 있다.
그는 이미 자고 있었다.
미선이는 밥을 다 먹어 간다.
그녀는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나에게 다가왔다.
•상대적 시제
나는 아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 지연이를 보았다.
절대적 시제 : 문장의 맨 마지막 서술어의 시제가 과거 → 과거
상대적 시제 : 문장의 중간에 포함된 동사의 시제가 현재 → 현재
2. 피동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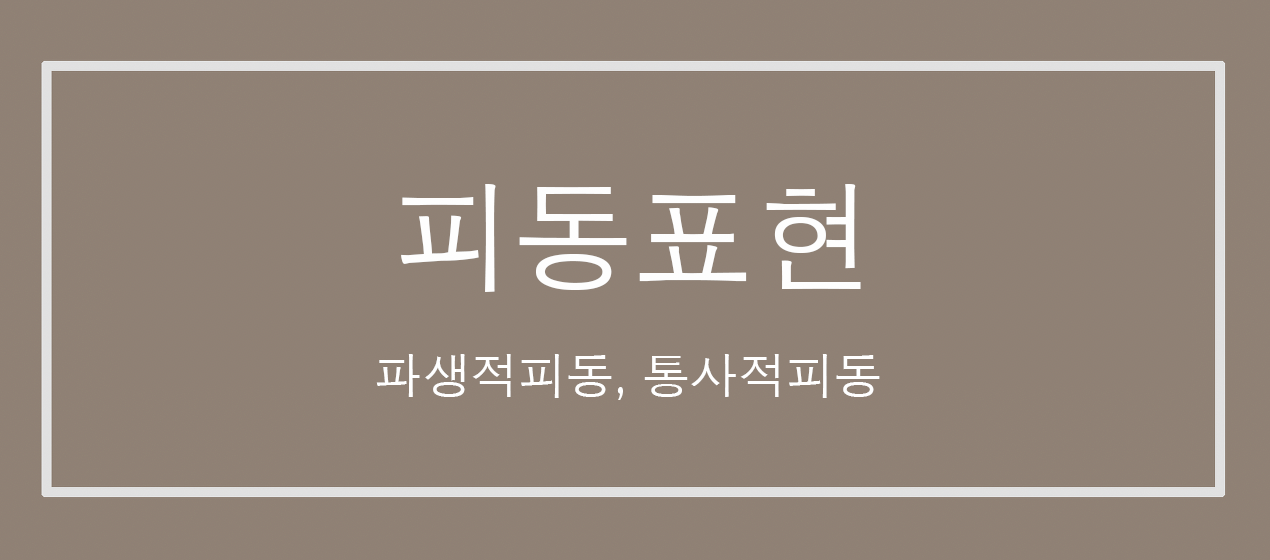
개념 :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動)이라 한다.
| 파생적 피동(짧은 피동) | 통사적 피동(긴 피동) |
|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실현된다. | ‘-어지다’ ‘-되다’, ‘-게 되다’로 실현 |
|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 이 볼펜은 글씨가 잘 써진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능동문의 주어 →피동문의 부사어
능동문의 목적어 →피동문의 주어
3. 사동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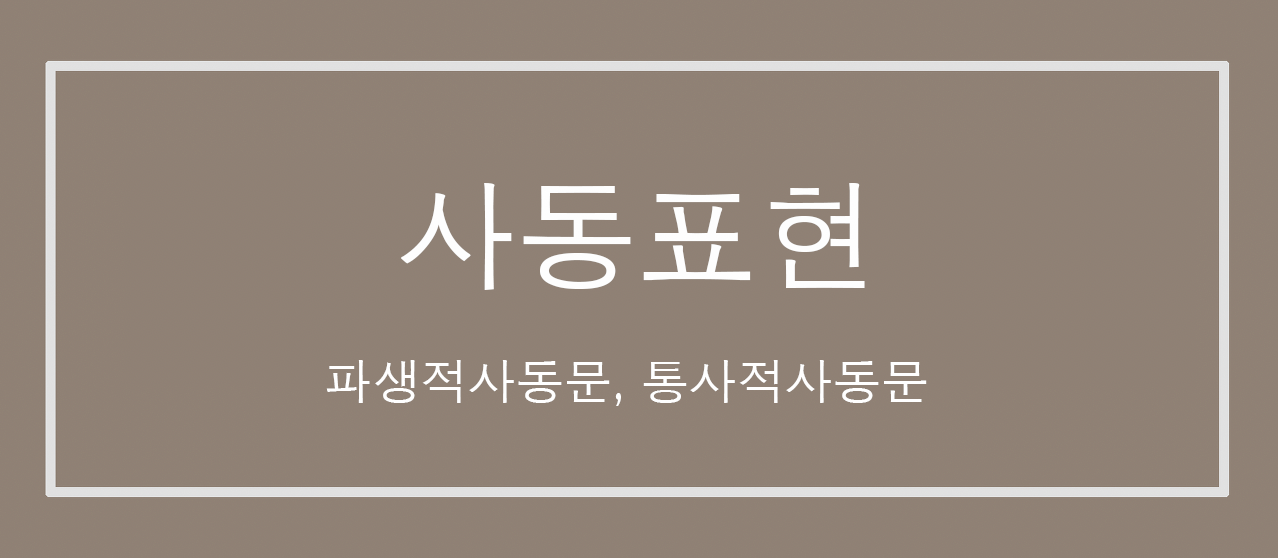
주어가 남에게 동작으로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使動)이라 한다.
| 파생적 사동문 (짧은 사동문) | 통사적 사동문(긴 사동문) |
| 주동사 어간에 파생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붙 어 실현된다. ‘서다’와 같은 일부 자동사는 두 개의 접미사가 연속되어 있는 ‘-이우’가 붙어 서 사동사가 되기도 한다. | 연결어미 ‘-게’에 보조 용언 ‘하다’가 붙은 ‘-게 하다’와 ‘-시키 다’ 붙어 실현된다. |
| 속다:속이다 익다:익히다 알다:알리다 맡다:맡기다 서다:세우다 자다:제우다 | 차를 정지하게 했다. 차를 정지시켰다. |
사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주동사가 형용사 또는 자동사이면 주동문 주어 →사동문의 목적어 사동문의 주어인 사동주는 새로 도입된다.
•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 차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직접 옷을 입혔다.
⇒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해서 아이가 직접 옷을 입었다.
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 언니가 아이에게 직접 옷을 입혔다.
⇒ 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으라고 시켜서 아이가 직접 옷을 입었다.
4. 부정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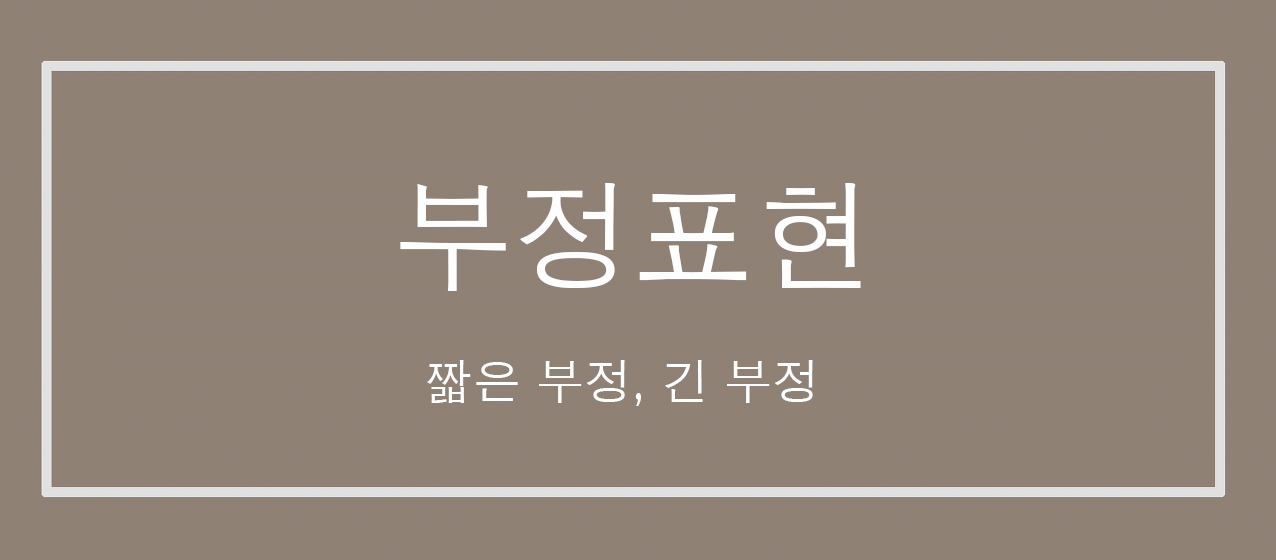
개념 : 부정문이란 긍정 표현에 대하여 언어 내용의 의미를 부정하는 문법 기능을 말한다.
(ᄀ) 짧은 부정문 : 긍정문을 그대로 둔 채 ‘안(아니), 못’을 서술어의 앞에 첨가한 부정문
(ᄂ) 긴 부정문 : ‘-지 않다’, ‘-지 못하다’가 쓰인 문장
| 짧은 부정문 | 긴부정문 | ||
| 의지부정 | 능력부정 | 의지부정 | 능력부정 |
| 안 | 못 | 아니하다 | 못하다. |
| 나는 그를 안 만났다. | 나는 그를 못 만났다. |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
부정문의 중의성?
부정문에서는 부정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같은 문장이라도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 성이 있으며, 수량을 나타내는 부사 ‘다, 모두, 조금, 많이’ 등이 있으면 부정의 범위에 그 부 사의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은희가 밥을 먹지 않았다.
부정하는 대상: '은희' '밥' '먹다'
이러한 중의성은 어느 곳에 강세를 주어 구별하거나, 보조사 ‘는, 도, 만’을 넣어서 해소할 수 있으며 문맥을 통해서도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다.
은희는 밥을 안 먹었다.
은희가 밥은 안 먹었다.
은희가 밥을 먹지는 않았다.
• 부정 표현의 특이성
‘모르다, 없다’는 특수 부정어로 짧은 부정 표현은 불가능하고, 긴 부정 표현만 가능하다. 이는 부정하는 의미가 문장 전체이기 때문이다.
모르지 않다, 없지 않다 : *안 모르다, *안 없다
부정문이 실제 의미로는 부정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림이가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의심의 뜻 염려의 뜻)
하경이가 갔지 않니? (확인의 뜻)
정리하면
1. 시간 표현: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으로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문법 범주이다. 발화시와 사건시가 어떤 관계이 있느냐에 따라 시제는 대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2.피동표현: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파생적으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이 있다.
3.사동표편: 주어가 남에게 동작으로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 한다.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이 있다.
4.부정표현: 긍정 표현에 대하여 언어 내용의 의미를 부정하는 문법 기능을 말한다. 길이에 따라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을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 공부 > 한국어 통사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어 통사론3(문장의 짜임, 홑문장, 안은문장, 안긴문장, 이어진문장) (10) | 2024.11.03 |
|---|---|
| 한국어 통사론(문장, 문장성분, 서술어, 주어,목적어,관형어,부사어) (5) | 2024.11.03 |

